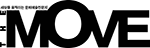- 세자르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
독일과 다르다’라는 점이 이 곡의 아름다움을 낳지는 않았다. 단지 프랑크의 고유한 음악어법이 너무나도 아름다울 뿐이다.
이 글을 쓰는 동안, 러시아 월드컵 4강전에서 프랑스가 벨기에를 격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는 환호하는 군중들로 뒤덮였다. 뉴스를 보는 독일인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의 경쟁관계는 음악문화에도 늘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두 나라 사이에 위치하며 인구의 약 절반이 프랑스어를 쓰는 벨기에도 특히 현악 강국으로 19세기에 뚜렷한 존재감을 유지했다.
1870년 9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는 스당 전투에서 프로이센 군대의 포로가 되었다. 보불전쟁에서 승리한 프로이센은 이듬해 1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방에서 의기양양하게 독일제국의 성립을 선포했다. 민중들은 굴욕적인 휴전조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월, 의용군이 조직한 파리코뮌이 수도를 장악했다. 뒤따른 정부군의 진압으로 최소 1만 명의 시민군이 목숨을 잃었다. 불신과 의기소침함이 파리의 공기를 장악했다.
1871년 11월, 파리의 살롱 플레옐에서는 제1회 ‘국민음악협회(Société Nationale de Musique)’ 콘서트가 열렸다. 주동자인 작곡가 카뮈유 생상스가 회장이 되었고, 세자르 프랑크, 쥘 마스네, 앙리 뒤파르크, 그리고 생상스의 수제자인 가브리엘 포레 등이 참여했다. 첫 콘서트에서는 프랑크의 3중주 B플랫장조와 생상스의 ‘영웅적 카프리스’ 등이 연주됐다.
국민음악협회가 표방하는 바는 구호에서부터 선명했다. ‘프랑스의 음악(Ars gallica)’이 그것이었다. ‘골족’을 연상시키는 라틴어를 사용했다. 골족 전사들이 대제국 로마에 맞섰던 것처럼, 음악계의 제국주의자로 자리 잡은 독일-오스트리아에 맞서겠다는 결의였다. 오페라 외에는 보잘것없어진 프랑스의 음악문화를 반성하는 토의가 이어졌다. 기악 분야에서 프랑스만의 독자적인 구조와 논리성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 협회의 회원들은 독일 고전 낭만주의의 견고한 구조에 틈을 내는 새로운 양식과 새로운 화성을 실험함으로써 새로운 ‘민족음악’을 찾고자 했다. 생상스는 전통적인 3, 4악장제에 대비되는 ‘두 개 부분으로 나눈 두 개의 악장’ 형식을 교향곡 3번과 피아노협주곡 4번에 도입했다.
프랑크는 각 악장의 주제가 다른 악장에도 등장하는 ‘순환(Cyclic)형식’을 사용했다. 교향곡 D단조와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가 대표적인 사례다. 초반 악장에 제시된 주제들은 다음 악장들에서 모습을 내보이며 마지막 악장에서 종합을 이룬다.
창립 15년만인 1886년, 국민음악협회는 균열을 겪게 되었다. 협회 설립을 주도했던 생상스와 뷔신이 프랑크 및 당디와의 불협화음 끝에 공동 회장에서 사직했다. 행동주의자였고 사교적이었던 두 사람 대신 평생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봉직했고 내성적인 학구파였던 프랑크가 회장직을 맡았다. 1890년 프랑크의 사후 그의 수제자 당디가 회장이 되는 등 이후 협회 운영은 프랑크 계열이 장악했다. 그러나 사실 프랑크는 고유한 프랑스인이 아니었다. 벨기에의 리에주에서 태어난 ‘이주민’이었다.
균열의 쟁점은 ‘비(非) 프랑스’ 작곡가의 작품을 협회 음악회에 소개하느냐였다. 생상스는 프랑스 음악가의 작품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크와 당디는 프랑스 음악에 발전과 혁신을 가져오려면 자극제가 되는 ‘국외’작곡가의 작품도 소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문제의 핵심은 전 유럽 음악계를 휩쓸고 있는 바그너적 정신과 기법의 침투를 용인할 수 있는가에 있었다. 생상스의 보수적 주장은 소수에 몰렸고, 다수의 음악가들은 ‘개방’을 선택했다.
생상스의 실패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던져준다. ‘공통 적’을 상정하고, 그 적을 회피함으로써 ‘우리’를 정의하는 순혈주의 또는 배척주의는 올바른 자기 형성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도 ‘저쪽만 아니면 괜찮다’는 적대논리가 팽배하다. 문화계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일본문화 비슷해 보이면 아웃이다’는 식의 담벼락 치기는 흔한 일이다. 물론 일본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가한, 또한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반성 없는 자세는 당연히 개탄할 일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실질소득은 일본에 그다지 뒤지지 않고, 한류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 고민 없는 배척은 콤플렉스와 통한다. ‘옆집하고만은 다르게’라는 자세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
| 김봄소리_Vi. |
8월 9일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김봄소리 바이올린 리사이틀>에서는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가 연주된다. 국내 바이올린 무대 뿐 아니라 첼로, 비올라, 플루트 리사이틀에서도 자주 연주되는 애호곡이기도 하다. 이 곡은 ‘프랑스의 새로운 구조를 창안해보자’는 순환구조 형식의 모색에서 나온 산물이다. 그러나 ‘순환형식’의 원형은 독일인 로베르트 슈만의 ‘교향곡 4번’에서 이미 볼 수 있었다. ‘독일과 다르다’라는 점이 이 곡의 아름다움을 낳지는 않았다. 단지 프랑크의 고유한 음악어법이 너무나도 아름다울 뿐이다.
유윤종 (음악칼럼니스트)
 |
THE MOVE Press@ithemo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