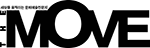|
독일 표현주의 대가 에른스트 키르히너는 독일인은 ‘무엇을’ 그릴까를 고민하고, 프랑스인은 ‘어떻게’ 그릴까를 고민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술을 표현하는 미학적인 발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핵심적으로 짚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무엇을, 어떻게? 라는 문제는 예술의 방식만이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한 핵심 키워드 일 것입니다. 또한 별개의 것이 아닌, 표현 방식의 다름일 것입니다. 키르히너는 이를테면, 당시 블랙리스트에 올라 불행한 삶을 살았었는데, 세계 1차대전이 발발해 참전한 후 적응을 못하고 요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겪은 후의 감정이 표현된 ‘군인으로서의 자화상’ 등 그의 작품들은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혁신적인 이념을 담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인식한 본성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전체주의 체제에 위험한 인물로 찍혔었지요. 20대에는 안락을 추구하는 낡은 힘을 거부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건너는 다리가 되겠다는 취지로 드레스덴 공대 건축학과에 다니던 친구들과 미술공동체 ‘다리파’를 결성해 활동했는데, 나치 정권에서는 이들 표현주의 작가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탄압했습니다. 이후 작품 전시도 거래도 금지당한 키르히너는 1936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와 합병해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3개월 뒤인 1938년 6월 권총을 자기 가슴에 쏘아 58년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진실하고 강렬한 그의 그림은 당시 시대상과 문명의 변화 과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 생생한 진실을 전합니다.
키르히너의 그림들을 보며 최근 국립현대미술관 바르토메우 마리 관장의 연임이 불발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의 고별 인사 편지를 받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마리 관장은 2010년 한국과 스페인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바르셀로나현대미술관(MACBA)과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 기획한 <언어의 그늘, 바르셀로나현대미술관 소장품전>을 열면서 인연이 되어 한국에 첫 외국인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오게 됐는데, 당시 무브 창간호에 인터뷰 기사가 실렸었지요. 그 때, 인터뷰에서 마리 관장은 “영감의 모토가 되는 것은 정형화된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 잘 알려지지않은 것을 대중 앞에 끌어내서 보여준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예술적 이상이 한국에 와서 어떤 결과와 성과를 나타냈는지에 대한 평가는 추후 밝혀지겠지만, 그간 잘 보여지지 않았던 다양한 현대미술의 새로운 방식들을 접할 기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짧은 임기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미술관 운영은 장기적인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고,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새로운 관장 공모가 나면서 벌써부터 여러 사람이 물망에 오르고 있어 하동안 소란스러울 전망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한국 국립미술관 50년 역사 속에 덕수궁관 개관 20주년, 서울관 개관 5주년을 지나며 아직도 그 정체성을 자리매김 하지 못한 채 혼란기인 듯 하다. 현대를 사는 오늘, 이 시대의 현대 미술은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Editor –in –Chief 임효정
임효정 기자 Press@ithemo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