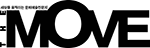창(窓)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줄 알면서도
한줄 시를 적어 볼가
.......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중
꽃 진 자리에 잎이 나니 꽃 지는 걸 서러워할 이유는 없다고 했던가. 현란한 꽃빛만이 아름다운 건 아니라지만, 활짝 꽃 피기 전 순절한 윤동주 시인을 기리기 위해 찾아간 교토 도시샤 대학 캠퍼스에 활짝 핀 홍매화는 무상하게 참 아름다웠다. 낯선 나라 이국땅 작은 ‘육첩방’ 에서 굴욕을 견디며 시인은 시가 쉽게 쓰여 지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나는 무얼 바라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자문하며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눈물과 위안으로 스스로에게 손을 내민다. 허름한 YMCA도쿄한국호텔에서는 시인이 지새웠을 몇 날 밤들과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를 쓰며 곱씹었을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새벽에 잠깨어 뜨거운 차를 마셨다.
압천변 오가며 걸었던 산책로, 기찻길, 교회 종소리, 봄이 오는 강가, 여름철 방학을 앞둔 친구들과의 즐거웠던 한 때, 이 모든 것들의 그리 길지도 않은 시간 속에 시인은 통렬한 자기비판으로 참회 같은 시를 써,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의 시를 읽으며 맑고 투명한 그의 정신(spirit)과 만난다.
그의 삶이 아름다운 건, 아름다운 시인 윤동주는 불행한 역사의 굴레 속에서 젊은 청춘으로 불의로 강점한 일제에 맞서 자신의 정체성을 침묵의 시로, 부끄러움과 참회로 항거했다는 것이다. 문학계 일부에서는 윤동주의 성찰적 언어에 대해 저항의 언어와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서정적 미학에 충실할 뿐이라고도 말한다.
이념에 사로잡힌 분단 민족으로 문학의 순수와 참여 논쟁은 오래된 논란인데, 이에 대해 문학비평가 김현은 날카로운 판단으로 일침을 가한 바 있다. “문학은 그러나 문학만을 위한 문학도 아니며, 인간만을 위한 문학도 아니다. 그것은 존재론적인 차원에서는 무지와의 싸움을, 의미론적인 차원에서는 인간의 꿈이 갖고 있는 불가능과의 싸움을 뜻한다.”라며 인간만이 반성할 줄 아는 존재라는 점을, 윤동주가 참회의 시인임을 상기시킨다.
분단과 관련해 상처받은 또 한명의 위대한 예술가가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고향인 통영에서 음악제가 열린다. 윤이상은 동양 정신과 서양정신을 접목한 음악으로 민족적 예술혼을 음악에 담아 세계적인 현대음악가로 추앙받는다. 그를 기리는 통영국제음악제는 올해 윤이상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세계 유수의 음악인들을 초빙해 그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연주한다.
벚꽃 날리는 봄날, 남해 바다의 풍광과 함께 음악여행을 가도 좋다. 탄생 100주년을 맞아 시와 음악으로 만나는 두 예술가의 예술혼이 부활해 재조명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예술은 혁명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의 조짐에 관여한다고 한다. 그 예술의 징후로 변화에 기여한다. 찬란한 봄날, 교토와 통영을 오가며, ‘시대처럼 올 아침’이 또 다시 기다려진다.
chief in Editor 임효정
임효정 기자 Press@ithemo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