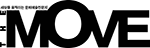- - 콘서트 오페라 <박하사탕> 무관중 온라인 공연-
 |
작곡:이건용, 대본:조광화,
예술감독·지휘:윤호근, 드라마투르그:이소영,
연주: 윤병길, 윤상아, 최병혁 등, 광주시립합창단, 광주시립교향악단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오페라 무용론자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도 내 편에 서 줄 분들이 꽤 있을 줄 안다. 도대체가 이 어마어마한 예산과 인력, 장비가 동원되는 것에 비해, 최선을 다해 연주하는데도 덜 완성된 듯한 찝찝함이 늘 남는, 거기다 전달되는 메시지는 헛헛하기 그지없는, 한 마디로 가성비가 없어도 너무 없는 장르가 오페라다.
한국창작오페라는 더 심각하다. 국민 세금이 아니면 제작될 수가 없으니 지원받기 좋은 재미없는 오페라가 대다수다. 그래도 이 업계에 종사하는지라 책무감으로 참고 앉아 공연을 보고 있노라면 시종일관 나의 집중을 가로막는 한 가지가 있다. 가사가 뭐라 하는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자막이 있긴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내가 자막을 글로써 읽고 있지 가사를 음악과 함께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다. 말과 음악이 딱 붙어 있지 않아서이다. 게다가 극의 전개는 안 봐도 알 것 같고 모든 인물은 한국창작오페라로 들어오면 처음부터 표정이 정해진 종이인형 같아진다. 음악으로는 사건이나 인물의 디테일을 영화나 연극처럼 잘 살리기 어려워서 그렇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오페라<박하사탕>이라고 별반 다를까? 현대사의 큰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40년이나 지나고 보니 광주민주화운동 역시 1980년 이후 태어난 세대에겐 6·25 얘기나 다름없는 옛날 이야기다. 더군다나 온라인 콘서트 오페라 형식(10월 31일 7시30분~11월 07일까지 유튜브에서)으로 진행되었기에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의상, 무대장치, 연기 등은 볼 수 없었고 쏠로 가수들을 제외한 모든 합창단과 지휘자,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2시간 20분동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오페라가 끝나고 생각해봤다. 무엇이 나의 주의를 이렇게 집중시켰을까?
내 주의를 집중시킨 건 우선 한국어가사가 음악에 딱 붙어서였다. 오페라의 시작을 여는 1장 봉우회 야유회 장면에서부터 이미 나는 무릎을 쳤다. 여기서의 합창은 우리말의 가장 친근한 말붙임새의 표본이라 생각된다. “어쩜 어쩜 너무 너무 멋져(여성합창), 글쎄 글쎄 뭔가 달라졌어(남성합창)” 그리고 나서 독창자(미애)가 “우리 신랑”, 합창단 “와우” 로 이어지는 장면은 일상어의 날 것 그대로 같으면서도 가사와 음악의 궁합이 착착 맞았다. 그러니 귀에 쏙쏙 들어왔다. 게다가 6장의 시위대 장면에서는 질퍽한 전라도 사투리도 쓰였다. “화순인디, 갸가 광주 가불더니 당췌 소식이 없어 안 왔소?” 또 2장의 망월동 묘역 장면에서는 묘비명의 한국어 이름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불려졌다. 이 장면은 정말 한국오페라사에 남을만한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어 이름은 2장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아주 인상적이다. 순임이 죽어가면서 그의 남편 광남에게 부탁하여 옛 애인 영호를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의 삼중창에서 “곱고 깨끗한 이름 윤순임”(영호), “착했던 사람 김영호”(순임), “윤순임, 사랑했었오”(광남)가 서로 시간차를 두고 교차하는데, 세 사람의 관계를 음악이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었다.
 |
두 번째는 음악이 인물들 간의 갈등과 대조를 더 생생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광주 출신 여대생인 명숙은 부드럽지만 카랑카랑한 운동권이다. 그녀가 합창과 함께 부르는 <삶은 아름다워>는 이건용표 노래의 단순하지만 흔치 않은 선율 진행으로 상처를 견뎌낸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이 아름답고 우아한 명숙의 노래와 합창은 곡을 마치기도 전에 치고들어오는 폭압적 소음과 이어지는 강대위의 <우리 덕분에>라는 명숙을 비아냥거리는 노래 덕분에 리얼하게 대조된다. 그리고 도청앞 시위 현장에서 모든 모순들이 뒤엉켜 갈등이 최고조로 오른 뒤 마지막을 장식하는 선율도 바로 이 “삶은 아름다워, 삶은 아름다워라” 라는 선율이다. 이 처참한 광경 속에서 이토록 잘 어울릴 수가 없다. 물론 장면과 인물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데에는 연주자들의 역할도 컸으리라. 또한 대본작가와 작곡가, 지휘자와 드라마투르그 등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협업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이 작품에서 한국오페라가 주는 매력을 발견했다. 한국어의 맛깔스런 음악화가 가능함을 발견했고, 한국오페라에서도 음악이 극적 긴장을 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대립을 더 리얼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게다가 음악은 공감을 배가시킨다. 음악은 본원적인 연민, 환희, 슬픔을 바닥부터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아침이슬> 노래가 나오는 시위대 장면이 바로 그러했다. 무대장치 하나 없고 마스크를 쓴 합창단원들만 보였지만 시위대 장면이 상상되고 가슴 속에서부터 숭고함이 느껴지게 만든 그것은 분명 음악의 힘이다. 그래서 연극이 아니라 오페라여야 하는 것. 아마도 이 장면을 보면 모두 공감할 것이다.
 |
이렇게 아름답고 처절하게 광주민주화운동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이 있을까? 20년전 영화 <박하사탕>은 영호의 삶이 왜곡된 현대사에 끼여 무너지는 과정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 끝에 광주가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므로 영화는 시종일관 어둡고 비참하다. 40년이 지난 후 오페라 <박하사탕>은 그 어둠과 공포를 가장 열정적으로 살아낸 개인들, 순임, 미애, 영미엄마, 함지박아줌마, 박병장, 홍자, 명숙, 그리고 묘비명 장면에서 이름 불려진 모든 이들의 삶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췄다. 어둠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생명력이 아니라면 가능하겠는가? 이 작품은 2020년에도 광주민주화운동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꼭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이 오페라를 무대 위에서 보고 싶다. 우리는 그럴 것이다. 1980년 5월, 그 때의 광주가 그랬던 것처럼.
이미경(음악학자 · 전남대학교 교수)
양몽원 기자 themove99@daum.net